
창밖엔 여름비가 내리네요. 아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요즘 기술 이야기들이 마치 고대의 신화처럼 거창하게 들려옵니다. 기술은 인류를 구원할까요, ‘아포칼립스’ 경고할까요? 일곱 살 딸아이를 보니, 거대한 이야기의 파도 속에서 어떤 푯대를 잡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AI 신화 현상? 기술이 왜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안 될까?

최근 실리콘밸리의 기술 리더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정말이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포칼립스’ 같은 AI 위험성 경고로 ‘AI의 대부’ 제프리 힌튼도 불안해하죠. 마치 예언자처럼요. 어떤 이들은 AI를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초지능적 존재로 묘사하며 ‘AI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아포칼립스’의 원래 뜻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계시’나 ‘드러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오히려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주는 약속의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기술 이야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겐 엄청난 두려움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약속처럼 들리는 거죠.
마치 여행 가이드가 동네 뒷산을 ‘영혼을 바꾸는 성지 순례길’이라고 거창하게 포장하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그 말을 들으면 ‘와, 대단한 곳인가 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부터가 과장일까?’ 궁금해지잖아요. 지금 기술을 둘러싼 담론이 딱 그런 느낌입니다. 구원과 파멸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들이 넘쳐나면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믿고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지 혼란스러워지죠.
인간은 왜 기술 속에서 신화를 만들어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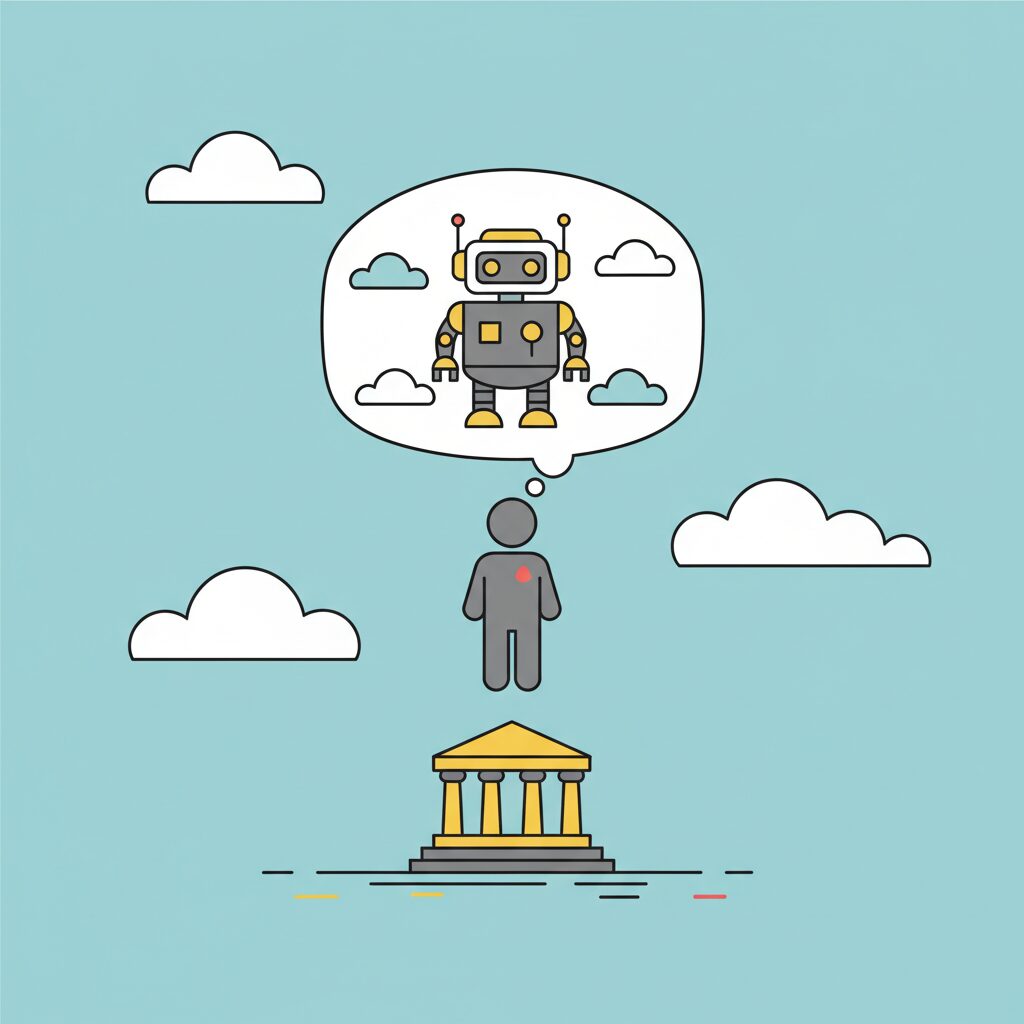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기술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걸까요? 종교와 기술을 연구하는 로버트 제라치 교수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찾고, 세상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 역할을 종교가 담당했지만, 점점 세속화되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그 빈자리를 압도적인 기술이 채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 아닌가요?
심지어 구글 엔지니어였던 앤서니 레반도프스키는 ‘미래의 길(Way of the Future)’이라는 이름의 AI 숭배 종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기술 중심의 문화가 그들만의 신념 체계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해요. 마치 고대 그리스인들이 인간의 힘을 넘어선 자연 현상을 보며 제우스나 포세이돈 같은 신을 상상해냈던 것처럼요.
얼마 전, 딸아이가 레고 블록으로 자신만의 왕국을 만드는 모습을 한참 지켜본 적이 있어요. 작은 손으로 블록을 쌓아 올리며 성을 만들고, 동물 피규어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며 완벽한 세계관을 창조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라는 것을요. 어쩌면 AI라는 거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 앞에서, 우리 어른들도 아이처럼 익숙한 ‘신화’와 ‘종교’라는 틀을 빌려와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과 자녀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도 흥미로운 사실이죠.
기술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나침반을 쥐여줘야 할까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나침반을 쥐여주어야 할까요? 맥스 테그마크 같은 학자는 우리가 신을 만들려고 할 때 비극이 시작된다고 경고합니다. 고대 신화에서도 신의 영역에 도전한 인간은 늘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죠. 이런 경고들을 들으면 덜컥 겁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모든 거창한 담론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기술을 신이나 악마가 아닌, ‘아주 유용한 도구’로 바라보게 돕는 것이라고 굳게 믿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라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아이에게 처음 가위를 쥐여줄 때를요. “이건 세상을 벨 수도 있는 무서운 물건이야!”라고 겁을 주지 않잖아요. 대신 “이걸로는 예쁜 종이를 오릴 수 있어. 하지만 손가락은 조심해야 해”라고 가르쳐주죠. 사용법과 잠재력, 그리고 주의할 점을 함께 알려주는 겁니다. 디지털 육아 관점에서 볼 때, AI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더 편리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동시에 어떤 점을 경계하고 현명하게 사용해야 하는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알려주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 부모의 역할 아닐까요?
아이에게 AI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숭배 대신 탐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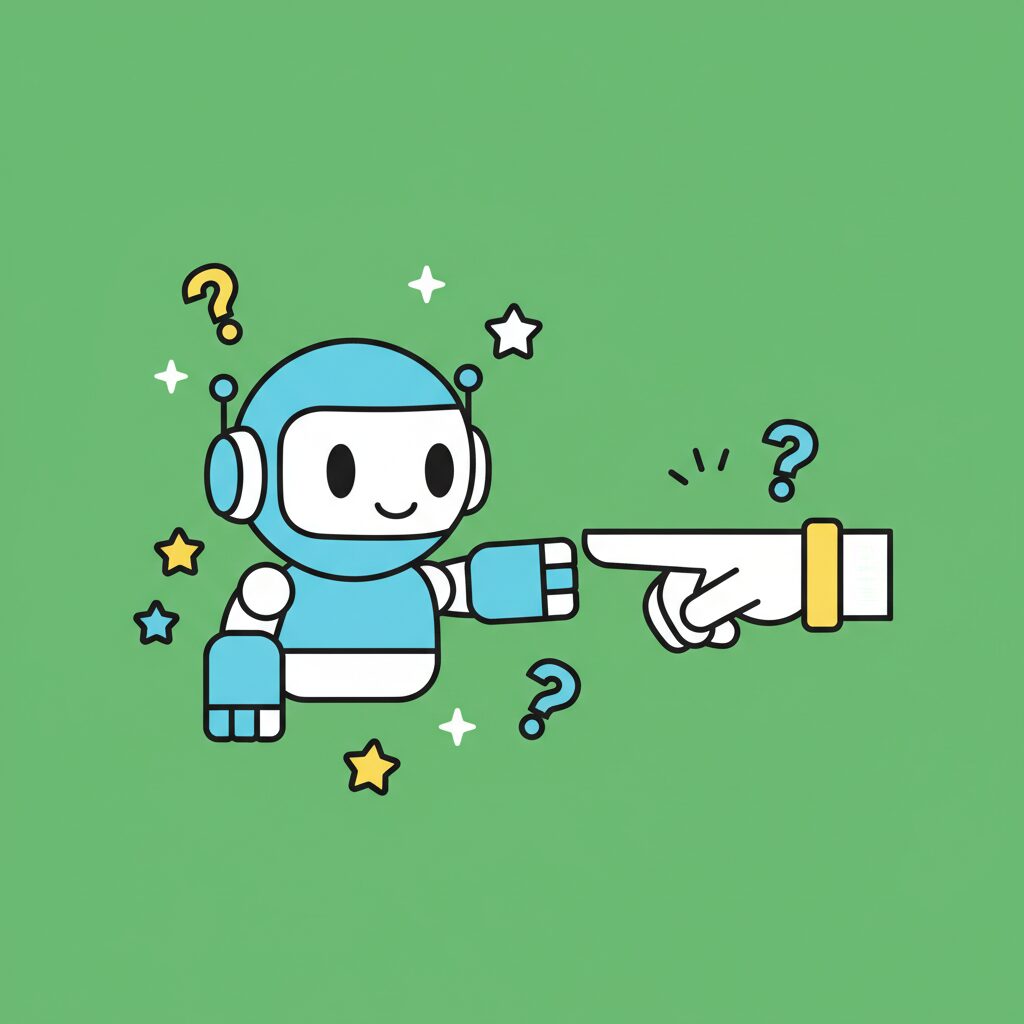
그래서 저는 딸아이와 기술을 가지고 ‘놀 때’ 거창한 이야기 대신 즐거운 질문을 던지려고 노력합니다. “이걸로 또 뭘 하면 재미있을까?”, “만약 이 로봇이 우리 가족이라면 어떤 일을 도와줄까?” 같은 질문들이요. 이런 대화를 통해 아이는 기술을 두려워하거나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신나는 장난감이 자 친구로 여기게 됩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인공지능 교육의 핵심은 바로 이런 상호작용에 있어요.
기술에 대한 종교적인 언어들은 어른들의 불안과 기대를 반영하는 거울일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 묵시록’이 아니라, 기술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건강한 자신감’입니다.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듯, 새로운 기술 앞에서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마음껏 탐험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자고요!
결국 미래의 이야기는 기술이 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가르쳐준 가치와 사랑, 그리고 지혜를 바탕으로 써 내려가는 것이니까요. 그 이야기의 첫 페이지가 두려움이 아닌, 반짝이는 호기심과 따뜻한 희망으로 채워지도록, 오늘 아이와 한 번 더 눈 맞추고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시작이 될 거예요.
출처: AI Apocalypse? Why language surrounding tech is sounding increasingly religious, Boston Herald, 2025년 8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