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가 ‘달은 왜 따라다녀요?’라고 물을 때, 우리는 종종 서로를 바라봅니다. 디지털 시대에 창문을 열어젖히고 밤공기를 마시며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작은 대화가 어떤 인공지능보다 값지게 느껴질 때가 있죠. 아이의 호기심과 첨단 기술 사이에서 찾아가는 균형의 자세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107번째 질문의 무게

하루에 평균 107개나 되는 질문을 받는다고 하면 정말 숨이 턱턱 막히죠? 그중 진정으로 답해줘야 할 질문은 몇 개나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은 대답 못한 질문이 더 마음에 걸리더라구요. 화이트보드 공식보다 눈빛으로 전해야 할 순간들이 있는 법이니까요.
‘왜 엄마는 나를 사랑하나요?’ 같은 질문 앞에선 스마트 스피커도 무력해집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꼬리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애플리케이션 없는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죠. 도마뱀 꼬리 재생에 대한 질문에 장난감 곰인형을 꺼내며 ‘네 생쥐 인형도 꼬리가 다시 자라면 좋겠다?’고 받아쳤던 순간, 우리 집만의 답변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그 순간, 우리만의 특별한 대화법이 탄생했네요!
공룡 박사님의 반전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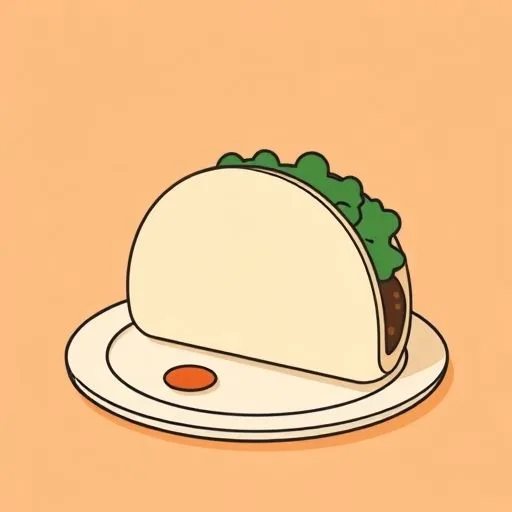
공룡 이름을 까먹은 아이에게 기계를 건네는 대신 ‘공룡 박사님, 여기 계신 분들 모르시면 안되는데요?’라고 장난을 건 날이 있었죠. 우리 셋이 만들어낸 ‘티라노고라스’와 ‘기린사우르스’라는 이름이 휴대폰 알림보다 밝게 빛났던 순간이에요.
기술이 아이들 탐험 본능에 날개를 달아준다는 말도 좋지만, 추리닝 차림 엄마가 여전히 최고의 길 안내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더라구요.
등하교 길에 개미집을 관찰하며 ‘왜 개미들은 줄을 서서 다닐까?’라고 묻는 아이를 보면, 디지털 기기보다 살아있는 교재가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걱정될 땐 ’30분 지났다고? 안돼!’ 소리 대신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원칙 세우기가 더 효과적이었어요.
엄마 손의 온도 한 스푼

초콜릿 녹이는 실험에서 알려진 용해점 이론보다 아이가 발견한 ‘엄마 손이 더 따뜻해서 빨리 녹는다’는 관찰이 더 빛을 발했던 날이 기억나요. 디지털과 실제 경험의 균형을 찾는 건 우리 부엌에서 시작되는 법이죠.
‘그럼 아빠 커피도 엄마 손에서 더 빨리 식을까?’ 같은 뒤따르는 질문들은 순수한 호기심의 연속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냄비에서 끓어넘치는 국물처럼 진한 우리만의 학습 레시피가 완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키친타올 로켓 발사 실패 후 우리가 함께 모은 해결책이 인공지능의 제안보다 훨씬 창의적이었던 경험도 있죠. ‘고무줄 에너지 저장 이론’이라는 이름과 ‘빨대 다단식 추진’ 아이디어가 합쳐진 작품이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작은 성공들이 쌓여 아이의 자신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면 기술과 인간의 조화가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Source: ‘Make AI an ally’, The Star, 2025/09/13 23: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