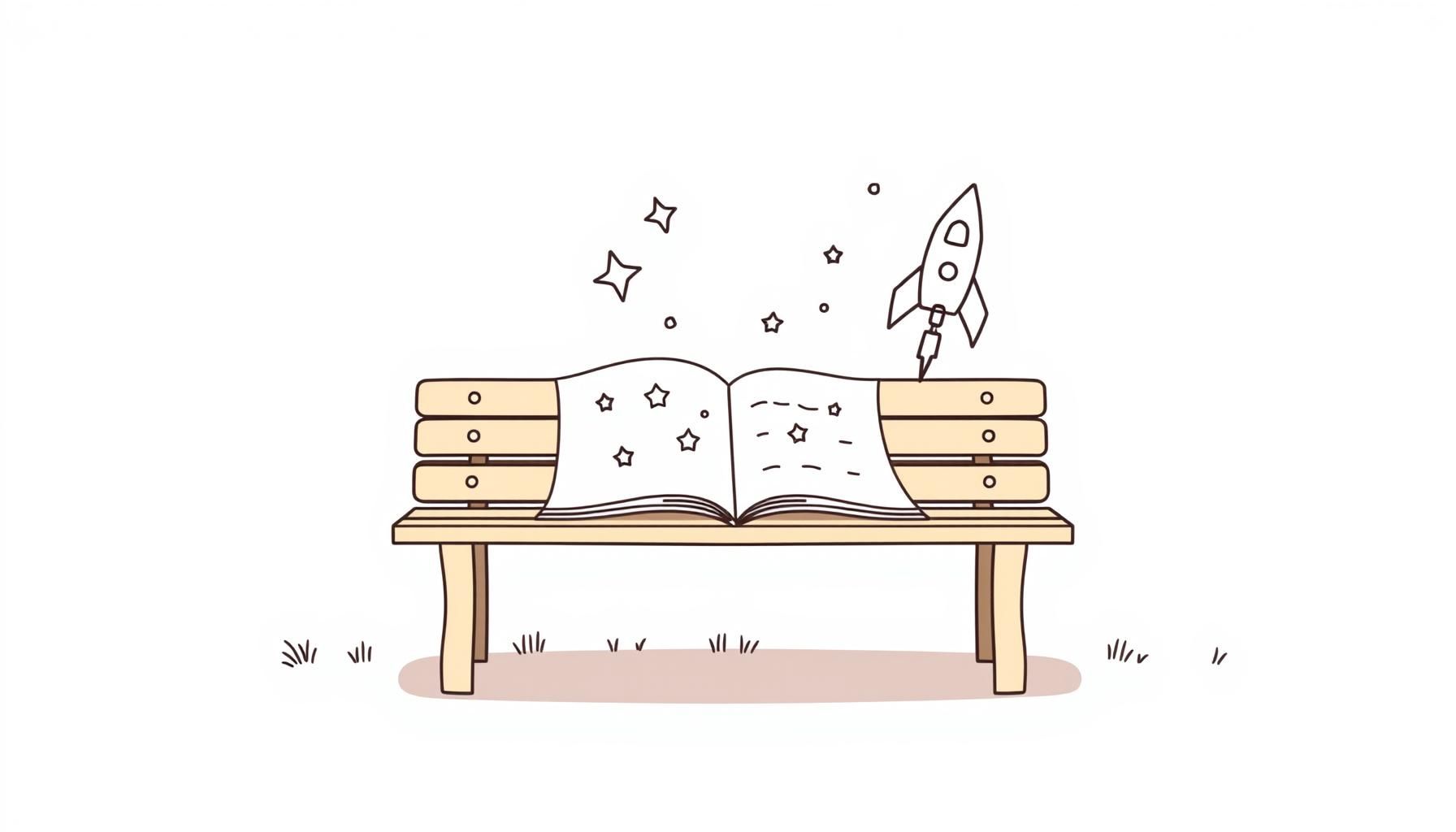
추석 연휴에도 풀잎으로 별자리 그리는 딸아이, 어느새 손끝에서 로켓 ‘HaniBolt 7000’을 탄생시키더군요. 보는 내내 어릴 적 추석 쇠기 전 아빠랑 손잡고 설렁탕 재료 골랐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걸 어깨 너머로 지켜보는 데 5분도 안 걸렸는데 세상이 이렇게 순식간에 달라지다니.
AI는 아동 창의성 행사장의 발판이 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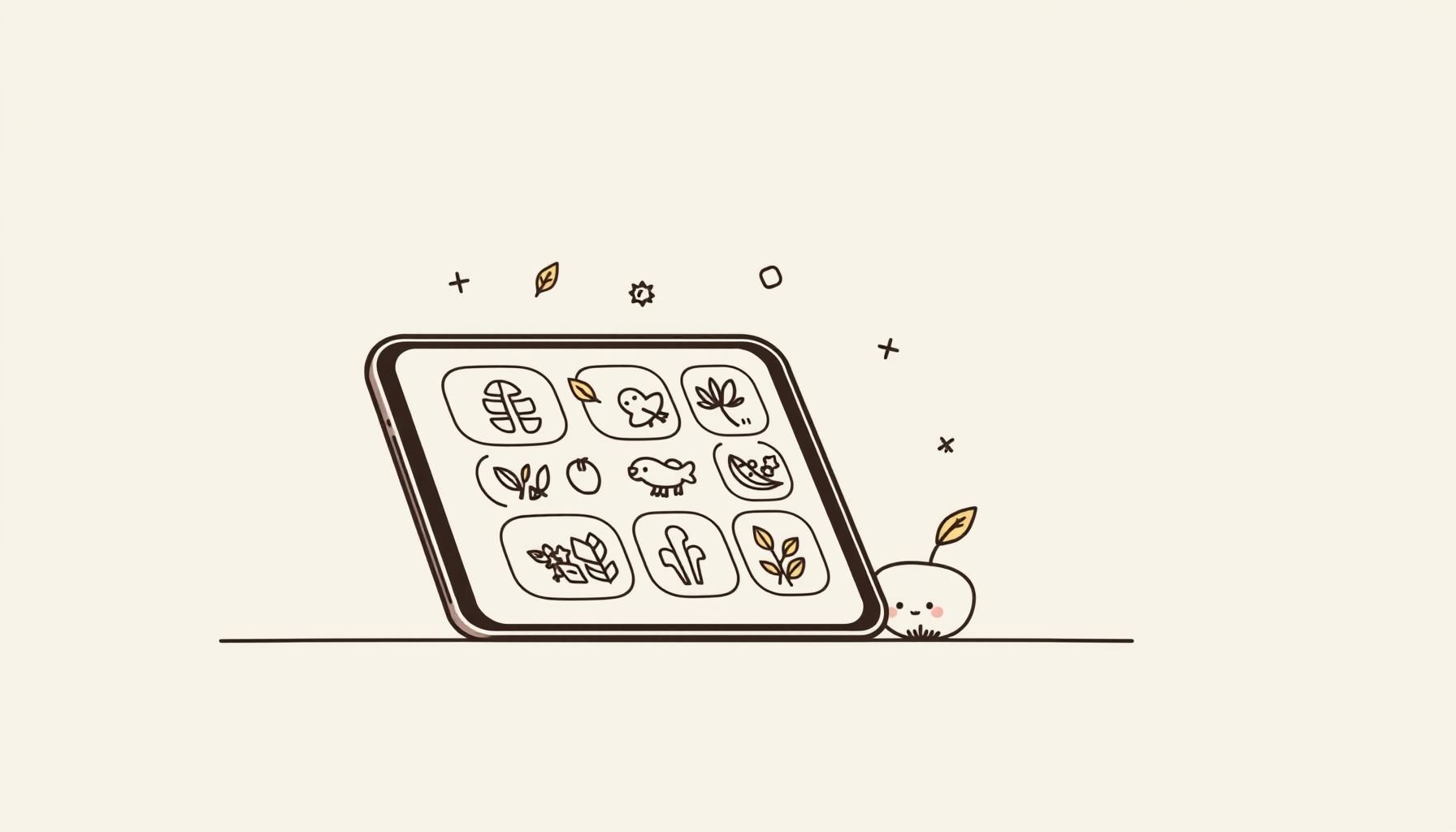
며칠 뒤엔 생태학 시간에 배운 도룡뇽마저 ‘해결사 뉴봇3’로 재구성하겠다며 컴퓨터 옆에 붙어 있더니, 저녁엔 직접 키노말 타임테이블까지 만들더라고요. 그 진지한 표정으로 “AI는 창조의 출발점이에요”라고 말할 때, 제가 성경 말씀을 인생 해석 도구로 쓰는 것과 뭐가 다르랴 싶더라구요. 어린 서.paths니스디ㅏ운 5학년 생협 활동처럼 다짜고짜 remix를 빚어내는 과정보다, 그 자체로 즐거워하는 반짝이는 눈빛이 더 중요했어요. 태블릿이 흥건한 도마 위에 쌓인 김치 속 발효균처럼 ‘창조’의 촉매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건 어쩌면 옛날 할머니가 구멍 난 도마를 고추가루 국민비서로 메우던 그런 유연한 지혜 아닐까요.
교육 AI의 직접적 도입보다 중요한 가치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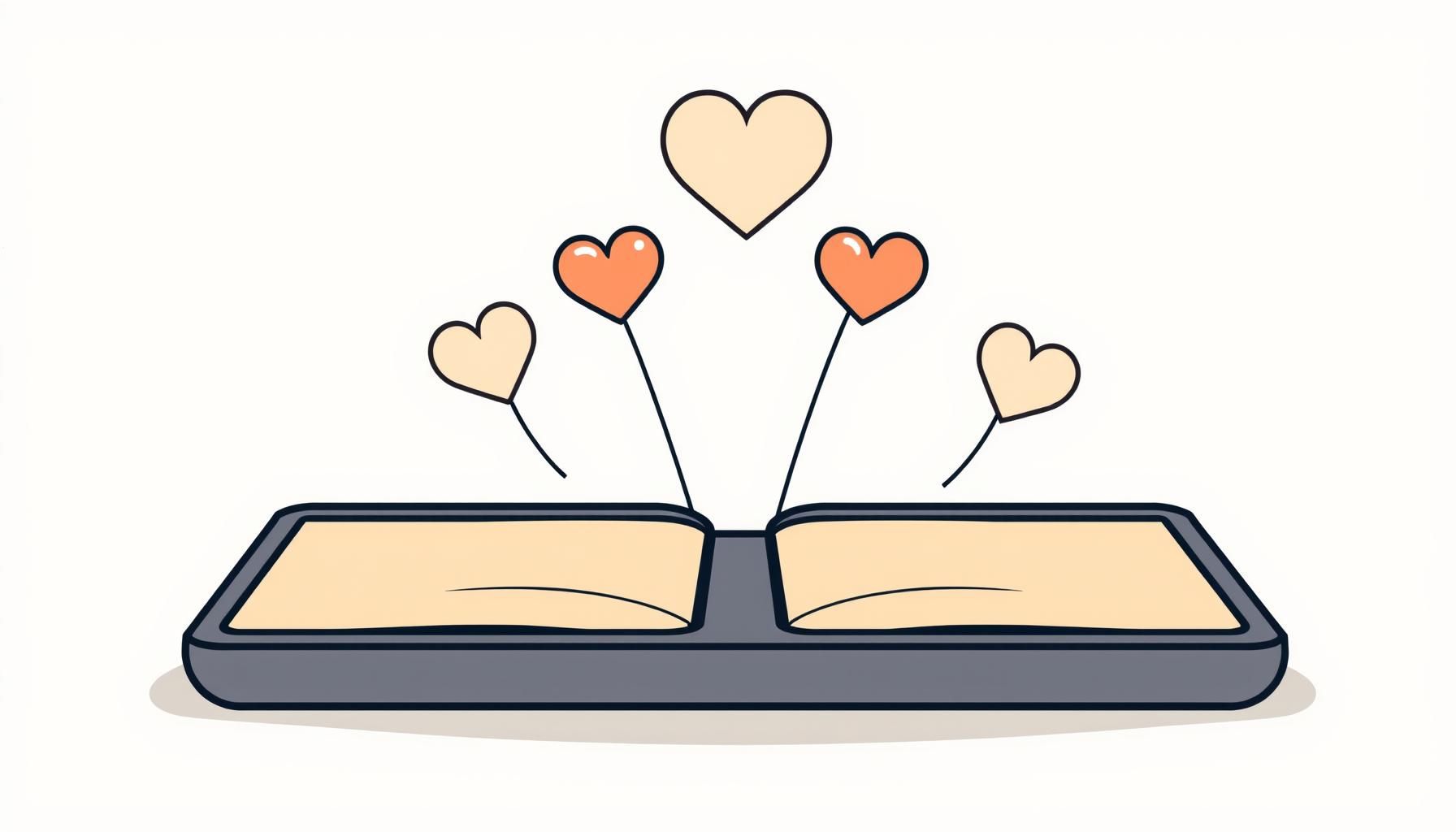
게임 속 가상의 비단치마보다 현실에서 찢어진 이마트 쇼핑백에 ‘이렇게 감싸면 돼!’라며 콩나물 키우는 신기루 보던 중 점심시간을 마주친 적이 있어요. 태블릿 속 얼굴없는 인형 dress-up도 모자라 hologram 한복저고리를 구상한 그 창의력이 멋지다고 생각하던 그 시간에, 막상 저희 둘은 AI가 필요한 순간마다 얼굴 보며 웃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혹시 기술의 겉모습만 줄 찍듯 받아들이는 건 아닌지. 어린이 밥상 위에서 다뤄야 할 가치들이 그 화면 안에 자리할 수 있을지 말이죠.
AI 교육 활용 시 부모가 지켜야 할 호흡
티끌만 한 사실감각부터 완전 새로운 비빔밥 조합까지, 달라지는 흐름을 함께 가다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전 딸아이가 AI로 만든 김치찌개 이미지가 입맛 돋우는 건 잘 봤지만, 다 먹고 난 후에야 그 양념의 영양성분을 실제로 재어 봤더니 1도 안맞더라고요. 웃긴 건 거기서 오히려 “다시 포장을 새로 하자”며 영양가는 찍는 걸 배운 거죠. Nicholas가 그 시도 중간에 링크 집중력 체크하며 딸의 손을 잡던 모습을 보니, 부모도 그 감noop을 풀어내는 점퍼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기껏 1%는 경고기능 탑재해도, 다른 99%는 그 새록새록 나는 호기심에 물들어보는 여유 그 자체가 배움의 비법 아닌가 싶더라구요.
학습 AI와 함께하는 아이들만의 세계관 정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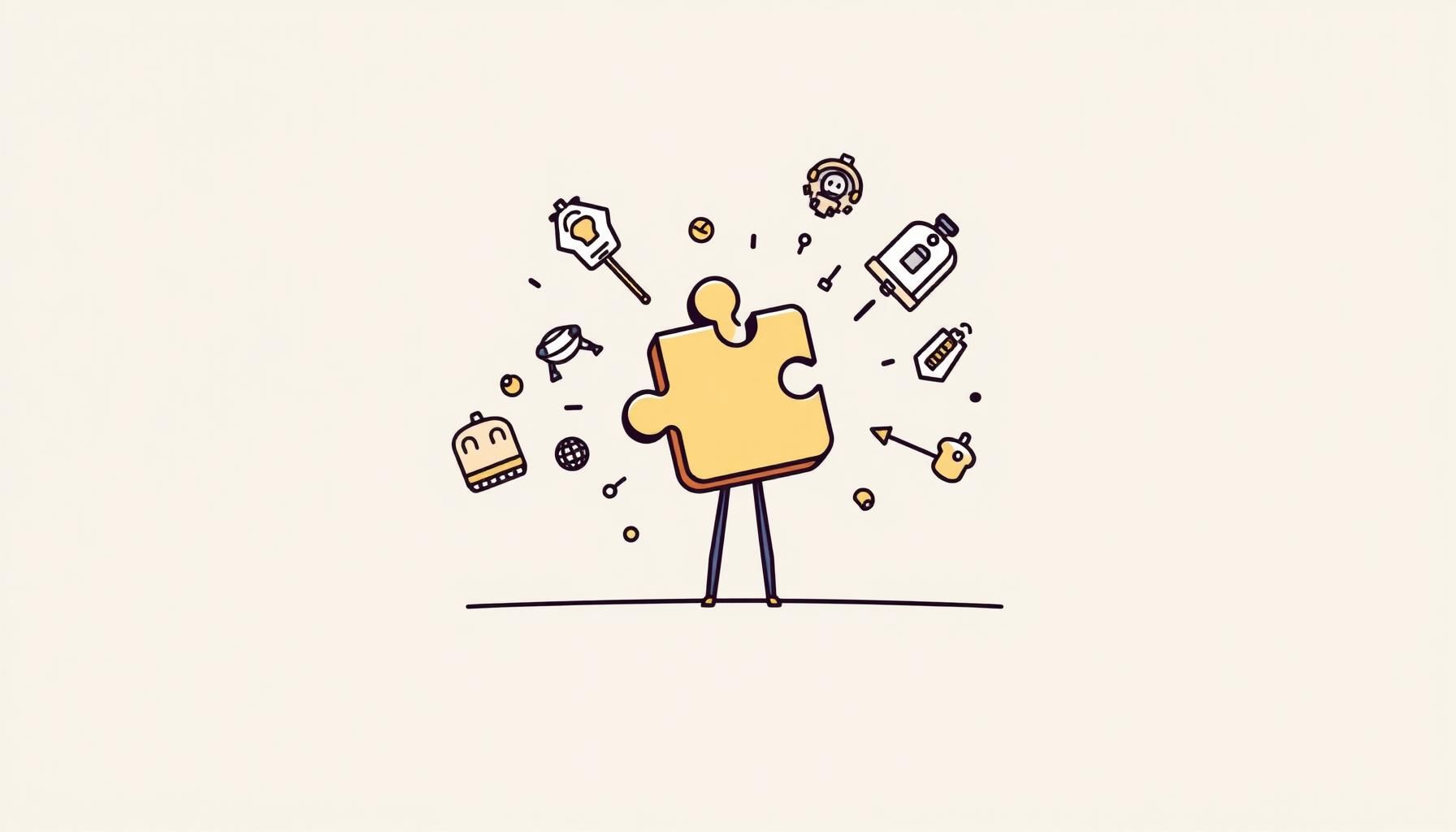
AI 본문에 담긴 공룡 시뮬레이션이 실제 베개 놀이감과 충돌하지 않던 그런 날이 있습니다. 정보를 ‘정답’대로 받아들이기보다, Max UI로 만든 ‘거주구역(?)’과 실제 현장 체험을 두 벌이로 나란히 붙여봤더니, 아이들은 서로 섞인 관심사를 공통 그래프로 옮겨담는 법을 열심히 고사리처럼 긁어모았어요. Imagination이 현실 활동과 통 속에서 질서를 만나는 이 묘한 저울질이야말로 우리 주말캠프 때 별빛박수치는 자연스러움과 다르지 않다고 느꼈죠. 지금의 “You, me, everyone remixible!”을 그 어린 전봇대 삐각따위로 쓰던건 어쩌면 ‘아이들만의 리믹스 언어’를 읽는 연습이었다고 해야하나? 자신의 망원경을 완성시킬 특별한 AI 경험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우운상 dnpgks 딸아이의 말까지 내려오기까지 부모들의 생각도 찐득찐득 검수가 필요하겠더라구요.
인생은 숫자 패스워드가 아니라 문장의 flow
에스프레소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날에도, AI가 본건 또래 행동 속에 스며들 수 있겠구나 싶은 요일이 있어요. 학교 교실 선반에 촌스럽게 놓인 닭강정 논쟁을 ‘구름 포맷’으로 저장하며, 딸아이가 태양계 장난감을 설계할 때 느낀 ‘AI 의도적 미사용’의 정서가 그 순간의 징검다리였다는 말이죠. AI 모델이 안 간 길 위에 아빠 걱정은 왜 가지 않을까요? 예전 Hofstadter 할아버지가 ‘의도치 않은 의미’를 다루셨던 책들을 읽으며 그 희망을 따라가는 게, 어쩌면 대부분의 ‘인류의 지식’을 품은 AI 프로그램에서조차 가장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고민이 실은 추석날 방금 구운 호박전처럼 AI와 2030세대 모두에 지나치지 않은 열기 그대로랍니다… 지속 가능한 배움의 끓임이란 그런 걸 말하겠죠?
Source: KDI 인공지능교육연구소, 2025-08-14 1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