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재우고 나니 문득 깨달은 게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던 중 최근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봤어요. 의료 AI가 X선 사진만 보고도 인종을 90% 정확도로 구분한다고 해요. 이건 오히려 경험이 많은 의사들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데이터를 많이 주면 줄수록 똑똑하다 느끼지만, 가끔은 잘못된 것을 배우는 모순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본 것을 그대로 따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편견을 반복하기도 하죠.
AI를 키우는 것이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지혜로운 가르칩이라면 어떨까요?
마치 아이들이 세상에서 배운 것을 의심하도록 가르치는 것처럼요.
AI 학습, 왜 다样的한 데이터가 필요한가요?

아이들이 매일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할 때, ‘균형 있게 먹어야 해요. 당근도 챙겨야 하고요.’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만약 그 아이의 인형들만 의견을 물어봤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쿠키를 좋아한다고 믿었겠죠.
어떤 AI 시스템도 이와 같아요. 특정 지역이나 그룹의 데이터만으로 학습하면 모든 것이 그와 같다고 착각하죠.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을 정확히 식별하지 못하는 얼굴 인식 도구 연구가 있었어요. 주로 밝은 피부 사진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이죠.
마치 특정 문화권의 요리만 내다 주고 다른 문화는 전혀 접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것과 같아요.
언어를 배울 때 다른 억양의 발음도 들어야 하듯이, AI도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을 담은 데이터가 필요하죠.
인종·성별·배경이 다른 데이터로 훈련 없이는 영양 부족이 되어 아이같이 실수를 하곤 해요.
따라서 우리는 전체적인 메뉴를 제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해요.
숨겨진 편견, 어디에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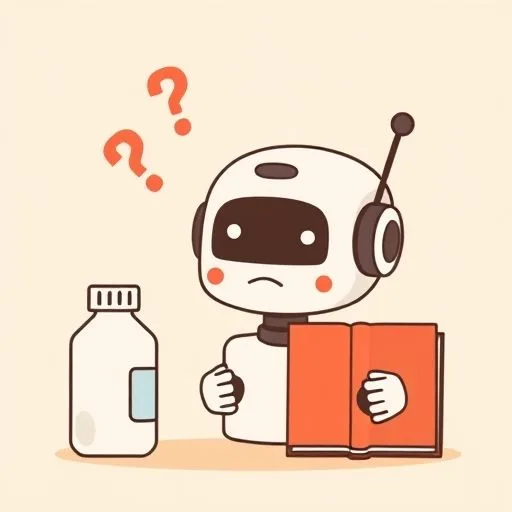
어디 공원에서 아이들이 원을 그리며 놀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남자아이들은 축구에서 항상 이긴다!’라고 했고요. 다른 아이도 ‘응, 더 잘해요.’라고 반응했죠. 소녀는 눈을 굴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의 순진한 생각이 빠르게 편견으로 변한다는 게 무섭죠.
AI도 똑같이 해요.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클릭베이트 제목이 가장 유용하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의견 동의해’ 같은 단순화로 가르쳐요.
수백만 번 반복되면 이 통계적 단순화가 유해한 고정관념이 되죠.
작년에 보육 앱을 만들던 때를 떠올려보세요. ‘이 기능이 누군가를 소외시킬까?’라고 묻곤 했죠. 이것이 바로 만드는 모든 것에 ‘샌드박스 테스트’를 적용하는 법이에요.
데이터 관점이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요? 진솔한 답이 불편하다면 아직 깊이 보지 못한 거예요.
공원의 아이들처럼 AI도 ‘잠시만, 더 조용한 목소리를 들어보자’고 말할 사람이 필요해요.
윤리적 학습, 어떻게 배어들일까?

함께 빵을 구우는 것처럼요. ‘빵이 충분히 불었을까요?’라고 묻고, 함께 오븐 온도를 확인해요. 여러 시각이 협업해 레시피를 확인하는 거죠. AI도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해요.
개발 단계부터 다양한 사람이 역할을 나눠 테스터로 작용하는 거예요.
‘완벽한’ 알고리즘을 출시하는 대신, 불확실할 때 ‘잘 모르겠어요’라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글자를 배우던 아이가 단어를 못 읽고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했을 때, 이를 도와주며 성장시켰듯이요.
요즘 알고리즘들은 결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과정에서 GPS가 ‘데이터가 더 빠르다’며 호수로 들어가라고 안내했죠. 조금이라도 회의감이 있었다면 ‘잠시만 다시 확인해 볼게요’라고 말했을 텐데요.
가장 믿음직한 시스템은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예요. 아이들에게 모든 답을 알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것처럼요.
Source: Why the AI Race Is Being Decided at the Dataset Level, Smart Data Collective, 2025/09/15 19:27:07
우리 아이들이 AI 시대를 건강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작은 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데이터의 양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런 지혜로운 가르침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