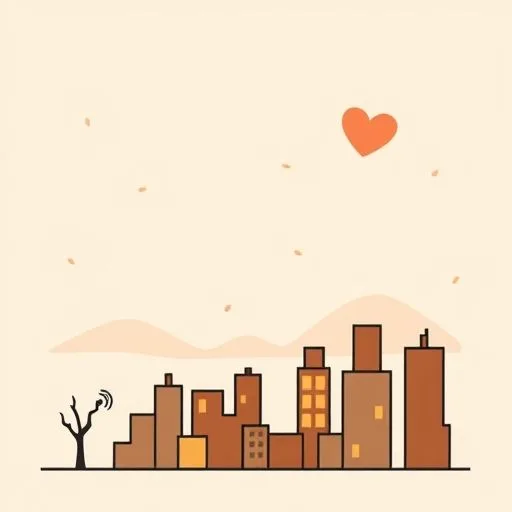
얼마 전 저희 아이가 “아빠, 바다는 얼마나 깊어?” 하고 묻는데, 순간 말문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AI에게 물어보니 ‘1만 1천 미터’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우와! 그럼 우리 직접 가보면 어때?”라고 묻는 거 있죠? 제가 “거기엔 뭐가 살고 있을까?” 하고 되묻자, 우리는 함께 심해 영상을 찾아보며 외계 행성 같은 바닷속 세상을 한참이나 상상했답니다.
마법 같은 전환은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AI의 답이 끝이 아닌,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죠. 빠른 답이 넘치는 세상에서 AI를 그저 ‘척척박사’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이 도구가 처음 불씨가 되어 더 깊은 경이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특별한 전문가가 될 필요 없습니다. 열린 마음, 신나는 상상력, 그리고 아이와 함께 탐험하는 작은 용기만 있으면 충분하죠. 이 순간을 함께하며, 단순한 답변이 아닌 열린 질문으로 창의력을 키우는 비결을 느끼게 되죠.
처음으로 이끈 질문

모든 여정은 이렇게 시작되죠. 간단한 질문이 우주를 향한 여행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AI 스피커에게 하늘은 왜 파랗냐고 물었을 때, AI는 교과서적인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만약 하늘이 보랏빛이라면’이라고 물어보면, 은하수 사진이나 다른 행성의 보라색 하늘을 찾아보며 상상하기 시작해요. 레일리 산란의 설명을 넘어, ‘혹시’라는 단어에 숨은 무한한 가능성의 이야기를 찾게 되죠.
AI는 시작점이 되고, 실제 여행은 아이의 호기심이 이끕니다. 우리 아이는 과학적 사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답변 너머로 상상하도록 이끌 때, 질문하는 용기와 미지의 세계를 응시하는 힘을 키우는 거죠. 마법은 기기의 정확성에 있지 않아요. 답이 문이 되길 바라며, 그 문을 함께 열어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빠른 답변 너머: ‘혹시?’의 기술

AI에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프랑스 수도는?’ 파리’라고 끝나죠. 하지만 그 상호작용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부모에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지구 무게가 597 퀸틸리온 톤인 것을 알고 싶어할 때, 숫자만 받아들이지 않고 마당에서 여러 색 돌을 모으며, 각 돌을 우리 인구를 대표한다고 상상하죠.
‘지구가 더 가볍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하면 아이의 눈에 새로운 관심이 깃들어요. AI의 진짜 힘은 정답을 척척 알려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아이가 더 멋진 질문, 더 신나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불쏘시개’가 되어준다는 점이죠! 생각만 해도 가슴 뛰지 않나요?
숫자가 냉담한 사실이 아니라, 이야기나 경이로움으로 이어지는 열쇠라는 걸 깨닫게 해요. 조용한 대화 속에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함께 경이로움을 나누는 언어를 만드는 거죠. 빠른 답변을 심도 깊은 대화로 바꾸는 그 능력, ‘혹시’라는 세계에 투자하는 순간, 우리 아이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기술 전문가가 필요 없습니다—단지 호기심만으로

기술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진짜 마법은 단순함에 있어요. 아이가 날리는 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물었을 때, AI는 공기역학을 설명했죠.
부모가 종이 타월롤로 날개 모양을 만들고 주방에서 함께 팔을 움직여 비행을 연습해보면 아이가 ‘새가 우리를 학교까지 데려다준다면 좋겠어’라고 묻는데, ‘새로운 탈것을 디자인해 보자’고 답해요.
호기심은 장난처럼 즐겁고, 배움은 모험의 쉬운 길로 이어져요. 기술 학위 없이도 가능해요. 마음을 열고 장난을 즐기며 ‘모르겠다, 같이 찾아보자’는 말만 하면 되죠.
진짜 배움은 컴퓨터보다, 호기심으로 마음을 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완벽한 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미지가 공포가 아닌 기회의 가능성임을 알려주면 돼요. 미소로 호기심을 받아들이면, 우리 아이는 두려움 대신 찬란한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죠. 우리가 기술 전문가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최고의 가이드는 바로 ‘같이 한번 해볼까?’ 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와 신나는 마음이니까요.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 아이의 세상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찰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