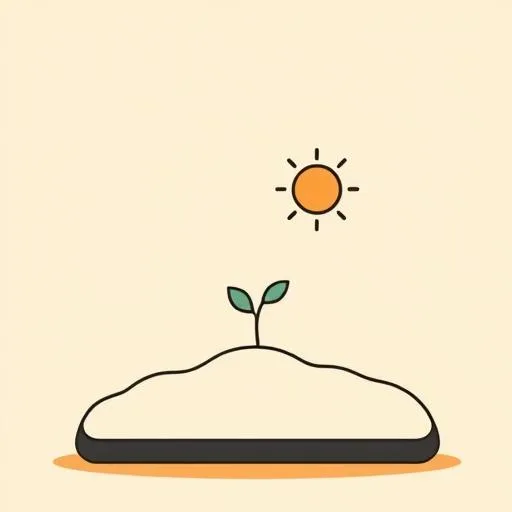
오늘처럼 눈부시게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아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풀숲에 쪼그려 앉아 한참 동안 무언가를 관찰하던 아이가 갑자기 저를 보며 외치더군요. “아빠! 여기 작은 새싹이 있어! 이 친구는 커서 뭐가 될까?” 그 작은 생명 하나에 온 우주를 담은 듯한 아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는데, 문득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건네주고 있을까요? 단순히 정답을 ‘캐내는’ 도구로만 쓰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아이의 호기심이라는 ‘새싹’이 더 큰 세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거름’으로 쓰고 있을까요? 최근에 읽은 ‘재생적 의도(Regenerative Intent)’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엄청난 힌트를 주었어요. 진짜, 부모로서 꼭 한번 곱씹어봐야 할 이야기지!
광부 대 정원사: 어떤 기술 양육법이 아이 미래를 바꿀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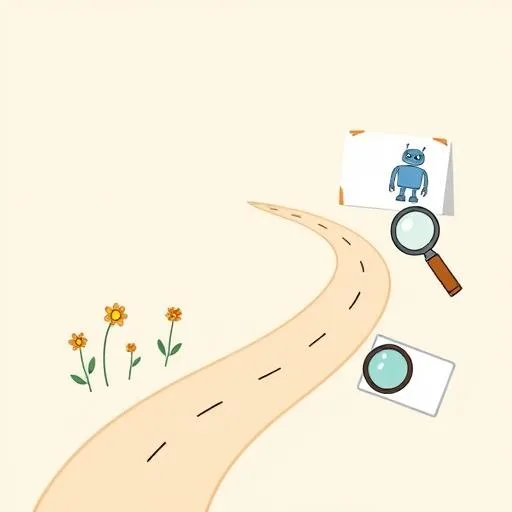
기사에서 제시한 비유를 보고 진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기존의 많은 기술들이 마치 ‘광부’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특정 가치(예를 들어, 단기적인 수확량이나 사용자의 관심)를 최대한으로 ‘채굴’하는 데만 집중하죠. 그 과정에서 산 전체가 무너져 내리든, 땅이 오염되든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요. 생각해보니 소름 돋더라고요. 우리가 무심코 아이에게 쥐여주는 영상 앱이 바로 그런 ‘광부’가 아닐까요? 아이의 집중력을 남김없이 채굴해서 광고 수익을 올리지만, 그 결과 아이의 창의력이나 사회성이라는 ‘산’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재생적 의도’를 가진 기술은 완전 달라요. 이 기술은 ‘정원사’처럼 행동하거든요! 정원사는 당장의 채소 몇 개를 수확하는 데 연연하지 않죠. 오히려 흙, 미생물, 꽃가루를 옮기는 곤충들까지, 생태계 전체를 정성껏 가꿉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건강해야 전체가 건강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와, 이 관점의 전환 진짜 완전 엄청나지 않아?! 우리 아이에게 기술을 소개해줄 때, 이 ‘정원사’ 마음을 꼭 장착해야 해요. 이 기술이 우리 아이의 호기심이라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꽃에 물을 주는가?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라는 나무를 키워내는가? 질문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이 마음 밭 일구는 재생적 양육법,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원사’처럼 기술을 바라본다면, ‘광부’의 단기적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죠. 광부의 방식은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농작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화학 비료와 살충제를 마구 뿌리는 거죠. 당장은 수확량이 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땅이 죽고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며 강물이 오염됩니다. 이 모습이 육아의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식당에서 아이가 떼를 쓸 때, 급한 마음에 스마트폰을 쥐여주는 것. 그 순간은 평화롭겠지만(단기적 이익!), 장기적으로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기다림을 배우는 ‘마음의 밭’은 점점 척박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양육은 ‘재생’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아이의 성적표 숫자 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아이의 내면 세계라는 생태계 전체를 꾸준히 돌보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 격려가, 마치 ‘토양’을 건강하게 하는 거름 같아요. 함께 책을 읽거나 보드게임을 하며 쌓아가는 유대감은 ‘미생물’처럼 마음 밭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죠. 기술은 이 과정에서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어요. 아이와 함께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며 생명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코딩 블록을 조립하며 논리적 사고와 창의력을 키워나가요. 여기서 완전 재미있는 순간 있었어요! 며칠 전 아이랑 코딩 블록 게임하다가, 갑자기 장난스럽게 로봇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장면이 나왔더라고요. 그 순간, 아이 눈이 반짝이는 게 보통이 아니었답니다. 이게 바로 기술을 활용해 아이의 마음 밭을 비옥하게 만드는 ‘정원사’의 지혜랍니다.
아이의 재생 능력을 믿고 키우는 기술 양육법은 무엇일까요?
‘재생하는 AI’는 한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적응하며 더 나아지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몸이 알아서 고치는 것처럼 자연스럽죠. 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으세요? 바로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넘어지면 스스로 무릎을 짚고 일어나고, 친구와 다투면서 관계를 배우고, 어려운 퍼즐을 몇 시간이고 붙잡고 씨름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갑니다. 아이들 자체가 바로 ‘재생하는 시스템’인 셈이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우리의 역할은 이 위대한 재생의 과정을 믿고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언가에 실패했을 때 “그것 봐, 안된다고 했지!”라고 말하는 대신, “와, 이렇게까지 도전하다니 정말 멋지다! 이번엔 뭘 배웠어?”라고 물어봐 주는 거죠. 기술을 활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온라인 게임에서 졌다고 속상해할 때, 게임을 빼앗는 대신 그 감정을 공감해주고 어떻게 하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기술을 통제와 처벌의 도구가 아닌, 아이의 자연스러운 성장과 회복 과정을 돕는 건강한 자극제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재생적 양육’의 핵심이에요!
가족만의 재생적 약속,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이 멋진 ‘재생적 의도’를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규칙을 만드는 대신, 가족 모두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가끔은 한가위 보름달 아래서 산책하며 자연과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기술을 통한 가족 시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길 바라요.
“우리가 이 기술을 사용하면,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가 더 커질까?”
“이 앱을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더 따뜻한 말을 건네게 될까?”
“이 시간을 통해 세상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이 생겨날까?”
이런 질문들을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누고, 우리 가족만의 약속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말 저녁은 스마트폰 대신 보드게임으로 연결되는 시간!’, ‘궁금한 게 생기면, 정답을 바로 검색하기 전에 각자 상상력을 발휘해서 답을 만들어보는 상상 놀이 시간!’ 같은 작지만 의미 있는 약속들이죠. 중요한 건 기술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관계와 행복을 ‘재생’하는 방향으로 기술의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기술이 우리를 갈라놓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을 함께 탐험하게 만드는 ‘다리’가 되도록 말이에요. 상상만 해도 정말 신나지 않나요?!
결국 기술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광부가 되기도 하고, 정원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들로 가득할 겁니다. 그 변화의 물결 앞에서 불안해하기보다, 우리 손에 ‘정원사의 삽’이 들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잠재력이라는 씨앗을 심고, 사랑과 지혜라는 물을 주며, 기술이라는 햇빛을 현명하게 활용할 때,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멋진 나무로 자라날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그 멋진 정원을 가꾸어 나가요, 어떨까요?
Source: Regenerative Intent: How AI Can Heal Instead Of Harm, Forbes, 2025/09/07 08:34:40
